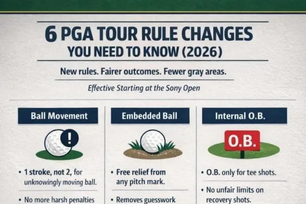골프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공을 치고 홀을 향한다. 하지만 그 안엔 룰을 넘어서는 깊은 배려가 있다. 에티켓이다. 다른 골퍼가 샷을 준비할 때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코스를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는다. 퍼팅 라인을 밟지 않고, 그늘에서 떠들지 않는다. 이 작은 행동들이 골프를 품격 있게 만든다.
이 에티켓은 18세기 영국에서 뿌리를 내렸다. 귀족들이 스코틀랜드의 황량한 들판에서 공을 굴리던 시절이다. 당시엔 예의가 신분의 증표였다. 상대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았다. 코스를 깨끗이 유지했다. 1744년, 세인트앤드루스 골프 클럽이 최초의 규정집을 썼다. 그 안에 “다른 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존중의 약속이었다. 19세기엔 골프가 대중화되며 에티켓도 발전했다. 미국 골프 협회(USGA)가 1897년 이를 공식화했고, 골프는 예의의 무대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 캐디로 코스에 서며 이걸 매일 보지 않으신가. 골퍼가 샷을 준비한다. “조용히 해주세요.” 눈짓으로 전한다. 코스에 난 구멍을 메우고, 디봇 자국을 다듬는다. 그늘집에서 떠드는 골퍼를 살짝 제지한다. 그 순간 여러분은 골프의 품위를 지킨다. 2019년 룰 개정으로 플래그 스틱 규정이 바뀌었지만, 에티켓은 흔들리지 않는다. R&A와 USGA는 여전히 “코스와 사람을 존중하라”고 강조한다. 조용함은 침묵을 지키고, 존중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 에티켓을 떠올리면 마음이 움직인다. 단순한 규범이 아니다. 사람 사이의 예의를 담는다. 코스에서 서로를 배려한다. 소란 대신 고요를 나눈다. 사회도 그렇지 않나. 존중이 없으면 관계가 어그러진다. 골프는 묻는다. “너는 얼마나 예의 바른가?” 이 질문이 코스를 넘어 삶으로 온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따르면, 타이거 우즈도 경기 중 관중을 조용히 하게 한 적이 있다. 작은 배려가 큰 승리를 낳는다.
2023년 마스터스에서 소란을 피운 관중은 퇴장당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골프 에티켓은 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논의할 만큼 세계가 인정한 가치다.
공 하나로 시작한 게임이 사람을 비춘다. 예의는 뭘까. 존중은 어디서 오나. 코스에서 골퍼를 돕다 보면 생각하게 된다. 이 에티켓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 캐디로 일하며 매일 느낀다. 이 작은 배려가 골프의 참맛이다. 에티켓 속에 삶의 아름다움이 있다. 고요는 마음을 열고, 배려는 사람을 잇는다.